| 72123 | 378 | ||
| 김길전 | 2022-06-27 16:40:00 | ||
| 평안하신 목민관(牧民官)님께 드리는 글 | |||
|
저는 목포에 거주하면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과연 신안군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2018년에 작고하신 저 한국문학평론의 큰 별 황현산 선생의 고향은 분명 신안군 비금인데도 대부분의 자료에는 아직도 목포출신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제는 최하림 시인의 시를 읽다가 문득 그이가 한없이 그리워져서 뒤져보니 출신이 어디에는 목포로, 어디에는 신안 안좌로, 어디에는 신안 팔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네비’에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를 찍고 그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이에게 가는 팻말 하나 없었습니다. 원산리 마을 쉼터에는 늙으신 어머니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저 어머니, 여기 최하림 씨 계셨던 집이 어디입니까?” “채하림? 그런 사람 없어,” 세 분 다 “내가 이 동네에서 여태껏 살았는데 그런 사람 없어.“ 한사코 없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한 예순 중반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마늘을 추리고 계시기에 물었습니다. “아, 최하림, 저 길로 돌아가면 농협 창고가 있는데 그 옆이 그 집이오.” 말대로 돌아가니 농협 창고가 있고 그 벽에 시인의 약력과 그의 시 ‘집으로 가는 길’과 ‘어디로?’의 작은 걸개 현수막이 걸려 바닷가의 마파람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붉은 지붕의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문패도 번지수도 없었습니다. 마당 화분에는 봉숭아가 붉었고 달아낸 유리장 안에는 언제 왔는지 만데빌라가 피어 붉었고 젊은 여인의 속옷이 빨랫줄에 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였습니다. 그곳까지 오는 길 ‘수국축제’와 ‘퍼툴 섬’은 그토록 눈을 끌었는데 한 시대 민중의 아픔을 어깨에 지고 노래하던 시인의 오늘이 그러하였습니다. 무릇 문화란 무엇이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였는지 그 존재의 이유일 것이며 그리하여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응답일 것입니다. 남귤북지(南橘北枳)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강남의 귤을 강북으로 옮기니 탱자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탱자 탱자 하더라는 말입니다. 대체 그분들의 그 신안군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다른 어떤 이가 그이의 시 ‘집으로 가는 길’을 읽다 불현 듯 그의 자취를 찾아 나섰다가 나 같은 절망만을 떠안고 돌아설까 심히 부끄럽습니다. 기왕의 길이어서 ‘서근 등대’를 돌아 채일봉 전망대에 올라 시인의 그 명시 ‘집으로 가는 길’의 원천을 유추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는 지우고 덧칠하는 색이 아닙니다. 부디 더는 산토끼 쫓다가 토끼 집 부수는 우(遇)를 범하지 마시기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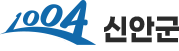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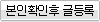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